마음이 유들해지는 시간이었다.
날 선 마음을 준비한 채 첫 페이지를 넘겼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의 ‘플레이 바우’를 떠올리는 무딘 마음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생명이기 때문에’를 ‘마음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로 치환하여 생각하니 쉽게 그리 되었고
동물을 향한 저자의 사랑을 목격한 이상 날을 꺼내들 수 없었다.
덧붙이자면, 수많은 동물들의 감정 이야기들이 ‘귀엽게’ 느껴진 이상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엔딩일 것이라 확신한다.
멋있는 주장이 있는 책이었다.
연역적 탐구만이 과학적 방법이라 여겨지는(진실이 아님에도) 세상에서
귀납적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인지동물행동학자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주관성에 솔직해지자는 - 동물의 감정을 관찰을 통해 연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자는 - 용기 있는 발언을 내뱉는다.
감정은 맥락 속에서 피어나기에, 감정 이해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물론 이야기는 객관적일 수 없다. 우리는 동물 본인이 아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다. 통제하면 맥락이 깨진다.
즉, 자연스런 환경에서 관찰하고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맥락의 감정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여러 시선을 마주하며 느끼는 점은, ‘과학’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오해가 많다는 거다.
과학의 어원은 ‘앎’이라고 한다. 앎은 계속해서 틀리고 바뀌고 발전해 왔다. 지금도 계속해서 틀리고 바뀌고 깨지고 구르며 진행 중이다.
그러니, 인지동물학자들이 동물을 이해하는 위 방식이 과학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용기있는 발언과 더불어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놀라운 동물의 감정 에피소드가 가득한 책이었다만
단 한가지, 저자가 권하는 ‘비건’의 제안은 내게 아직 버거웠다.
유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살생은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현재 자본주의 육식업 시스템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어업이 아닌 취미로써의 낚시도 역겹다.)
그렇지만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함’은 별개의 문제로 느껴진다.
“잡식동물 중 1개 종인 인간으로 진화에 의한 육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
이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된 생각은 끝없는 가지를 펼쳤다.
* 인간外동물과는 다른 잣대로 인간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또다른 인간우월주의의 일종이 아닐까?
* ‘감정과 지능을 가진 동물이기에 살생이 옳지 않다’는 논리가 곧 ‘동물의 감정과 고통을 모른다면 육식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가?
* 인간外육식(혹은 잡식)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들이 다른 동물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그들의 육식을 금지해야 하는가?
* 현재 진행되는 식물의 감정에 대한 연구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육식을 넘어 채식 또한 금지되어야 할 것인가?
답이 없는 질문이 가득 차 머리가 복잡할 때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동물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허나 그 행동이 인간에게 대항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일순간 비판적 관념의 무의함이 우스워졌다.
중요한 건 행동한다는 거다.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으로 동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면 된다.
동물을 존중하자. 육식을 위한 육식은 지양하자. 동물 산업을 마주함에 신중하자. 동물을 칭함에 겸손하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자. 다만 공감과 배려를 중심으로.
책을 끝까지 읽던 날 우연히 오목눈이를 가까이, 정면으로 볼 기회가 있었다.
오목조목 귀여운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자니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자그마한 생명체가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버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피어올랐다.
(지금 생각하니, 오목눈이도 나를 보며 그 마음을 눈치챘을 수도 있겠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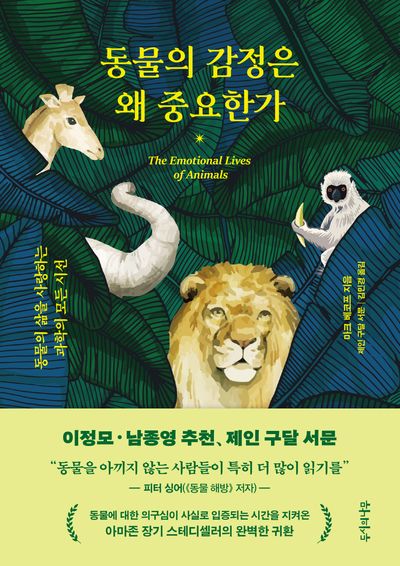
'책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 (2) | 2025.01.27 |
|---|---|
| 야마모토 케이의 [질투라는 감옥 - 우리는 왜 타인에게 휘둘리는가] (3) | 2024.12.24 |
| 이태준 작가의 [무서록] (1) | 2024.11.04 |
|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2) | 2024.10.14 |
| 허먼 멜빌의 [모비 딕] (1) | 2024.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