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게 아파서 휴가를 낼까 말까 고민할 때면 도대체 아픈게 뭘까 생각한다.
분명히 이정도면 아픈 것 같기도 한데
콕 집어서 병인가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만큼의 병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나는 건강한 상태인가? 자문하면 분명히 아닌데
모두가 겪는 스트레스성 어쩌구겠지 생각하면 넘겨야지 싶기도 하고
어렵다
의사선생님이 병이라고 말해주면 건강하지 않은 거고
병이 없다고 말하면 난 건강한 걸까?
건강에 대한 고민이 유난히 깊어진 요즘
좋은 기회에 건강에 대한 '수치화된' 책을 읽게 되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
범국가적, 아니 범세계적으로 규정된 건강에 대한 정의들과 판정 지표들,
통계 자료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었고
수많은 수치들을 '나'에 대입해 보는 재미가 있었다.
나는 이 자료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n년 후의 나는 자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시야가 좁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에 비해 주관적 건강을 상당히 낮게 평가한다.
생의학적으로 건강한 편임에도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에는 정서 상태, 경제적 요인, 피로감, 사회적 지지 등의 수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결국 삶의 질이 주관적 건강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재미있는 점은
낮은 주관적 건강은 의료 이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최고수준의 의료보험으로 안그래도 아무때나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의사를 자주 만나 진단을 받을수록 내 건강에 대해 더 안좋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유 없는 피로한 하루가 모여 건강에 대한 의심이 쌓이고
의심이 문서화가 되는 순간 불건강으로의 확신이 만들어지고
확신으로 더욱 문서가 쌓일수록 건강보험비는 상승하고
또 세금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에 대한 의심이 쌓이는
이 물고 물려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우스운 상황
이 거대한 굴레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해서는 삶의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자명하다
물론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노력이 더블링되어야만 하는 거고
한국 사회의 기이한 형태가 개인의 판단과 맞물려서 경제적 이슈를 발생시킨다는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싶었다.
내 생각이 내 아픔이 모두 사회적 현상일 수 있다
과연 나는 건강한가, 건강할 것인가
우리는 건강한가,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에게 달린 문제이니 모두의 지혜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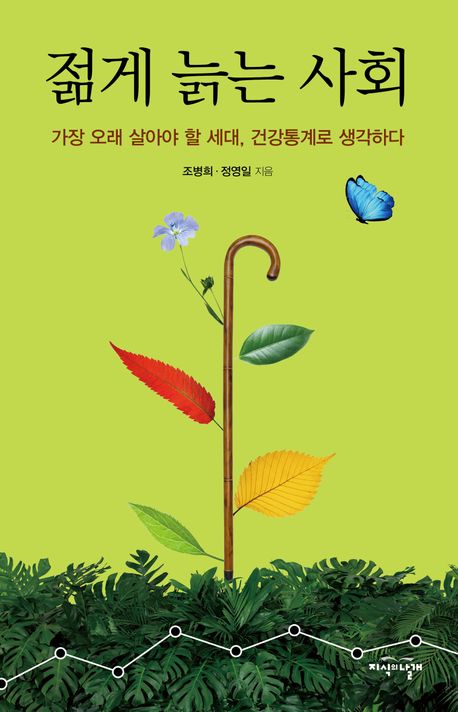
'책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해영의 [다른 듯 다르지 않은] (0) | 2024.08.14 |
|---|---|
| 권혁일 작가의 [첫사랑의 침공] (1) | 2024.08.05 |
| 서장원, 예소연, 함윤이 작가의 [소설 보다 여름 : 2024] (0) | 2024.06.21 |
| 백수린 작가의 [여름의 빌라] (0) | 2024.06.01 |
| 백수린 작가의 [눈부신 안부] (0) | 2024.06.01 |



